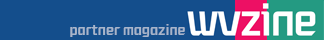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을 총괄 운영하는 ㈜슈퍼레이스 조직에 최근 들어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시즌 중반에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인사(人事)가 단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슈퍼레이스뿐만 아니라 레이싱팀과 드라이버, 그리고 국내 모터스포츠계 전반이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경주이고, 그 중심을 오랫동안 충실하게 지켜온 이가 바로 김동빈 전 대표이사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2003 코리아 투어링카 챌린지를 통해 모터스포츠와 인연을 맺은 인물. 자동차경주 프로모터로 업계에 뛰어든 그는 이후 RV 파워 챌린지 대회를 창설, 운영했고, 2005년 9월 CJ주식회사 스포츠마케팅 부서에 입사해 모터스포츠 사업을 담당했다.
2006년 9월 ㈜슈퍼레이스 전신 KGTC(Korea GT Championship)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아시아 최초의 스톡카 시리즈 슈퍼6000 클래스를 창설한 김 대표는 그동안 나이트 레이스, 한중일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주도적으로 기획하며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여기에 더해 다이내믹한 서포트 레이스를 추가하며 레이싱 카테고리를 넓혀왔다.
국내 정상 자동차경주 성장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진 공을 인정받은 김 대표는 2018년 12월 ㈜슈퍼레이스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대표이사 취임 후 밝힌 그의 첫 일성은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대중적인 주말 컨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김 대표는 한층 강화된 주말 나들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들면서 견고한 팬층을 확대해 나아갔다. 아울러 다채로운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를 팬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개막전부터 최종전까지 각 라운드 별로 차별화된 이벤트를 선보였다.
김 대표가 구상한 중장기 프로젝트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코비드-19 시기 이전에 이미 연간 18만 관중을 상회한 데다, 올해는 20만 관중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대회 운영 전반과 관련해 몇몇 잡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김 대표가 이끌어 온 ㈜슈퍼레이스는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꾸준하게 성장궤도를 밟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7월 현재 슈퍼레이스호는 암초에 걸린 모습이다. 시리즈 1~3라운드를 원만하게 소화하며 순풍에 돛을 달았지만, 대표이사 교체라는 악재와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은 ‘시즌 중반에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인사가 단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의식한 듯, ㈜슈퍼레이스도, 후원사 CJ그룹도 대표이사 교체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물론, 조직의 미래를 위한 인적쇄신은 언제라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마땅하다. 다만, ‘슈퍼레이스 발전을 대전제로 구상한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표이사 변경이 올바른 선택인지’, ‘지금이 그 적기인지’, 또한 ‘신임 대표이사가 최종 인사권자의 의중을 명쾌하게 풀어갈 적임자인지’에 대한 진중한 고려가 읽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앞선다.
덧붙여 ㈜슈퍼레이스와 CJ그룹 계열 후원사를 믿고 오랜 시간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함께 한 레이싱팀, 드라이버, 그리고 각 팀 후원사들에 대한 배려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출전 중인 다수의 팀 관계자들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을 드러냈다. 익명을 전제로 기자와 통화한 유수의 팀 관계자는 “현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내년부터 슈퍼레이스를 떠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하겠다”는 심중을 분명히 밝혔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선수들의 동요도 감지된다. 복수의 드라이버들은 기자에게 “슈퍼레이스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김동빈 대표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특별한 이슈 없는 대표이사 교체가 슈퍼레이스, 더 나아가 국내 모터스포츠 전반의 발전에 어떤 실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염려된다”는 의중을 전했다.
자동차경주 프로모터 대표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들지 않더라도, 이렇듯 여러 면에서 ‘밝은 미래가 예견되지 않는’ 이번 인사는 모터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밑거름 삼아 열심히 달려온 국내 레이싱팀과 드라이버들, ㈜슈퍼레이스 구성원,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본분에 매진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대회조직위원회 모두가 쌓아온 각고의 노력을 십분 반영하지 못한 단상(斷想)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을 가볍게 넘어서기 어려울 듯하다.
아울러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슈퍼레이스가 당초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양산한다면, 최종 인사권자는 그에 대한 후폭풍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박기현 기자 l 사진 정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