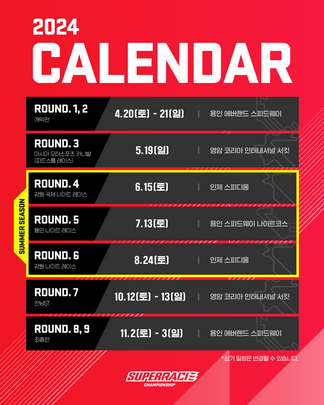자동차경주 역사는 자동차의 등장과 더불어 출발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동력장치를 이용해 네 바퀴를 굴리는 자동차가 등장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을 무렵부터 스피드 매니아들의 가슴 속에서 모터스포츠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한 때문이다. 지구촌 자동차경주의 효시는 1894년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루앙’ 레이스였다. 프랑스 신문 <르 쁘띠 주르날>이 주최한 첫 경주 우승자는 피에르 기파르. 당시 그의 주행거리는 80마일(약 129km)로 기록되어 있다.
초기 카레이스는 도시와 도시 사이를 달리는 기록 경주였다
도시와 도시 사이를 달리는 초기 자동차경주는 오늘날 랠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동차경주 전용 서킷에서 레이스를 펼칠 준비가 되지 않은 때인 만큼 개별적으로 출발해 주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가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자동차경주는 1896년 프랑스자동차클럽(ACF)이 주최한 파리-마르세이유 왕복 경주였다. 1897년부터는 새로운 흐름이 레이스 현장에 나타났다. 경주차와 일반 자동차가 차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 드라이버들은 흙받기나 시트 쿠션처럼 주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을 떼어내 무게를 줄이는 한편, 카메이커들은 더욱 강력한 엔진을 개발해 경주차에 적용했다.
경주차의 출력 상승은 두 가지 변화를 동시에 가져왔다. 이전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한 위험성 증가로 예상치 못한 사고도 발생했다. 레이스 중 첫 사고는 1898년에 일어났다. 파리-니스 구간을 달리는 레이스 출발 직후 벤츠 드라이버 드 몽태리올과 그의 친구 드 몽테냐크 후작의 충돌 사고였다. 이 사고로 두 선수는 다치지 않았지만, 머리에 부상을 입은 미캐닉이 세상을 등졌다.
사고의 여파는 곧 여러 곳으로 퍼져 여타 자동차경주마저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파리-암스테르담 경주를 중지시키려는 파리경찰청의 압력은 드라이버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레이스에 출전하는 차들은 기차 편으로 파리경찰청 관할구역 밖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경주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1900년대 초반에는 ‘고든 베네트 레이스’가 인기를 끌었다. 독일이 주관한 이 경주는 한동안 팬들의 이목을 받았지만, 1906년에 종말을 맞았다. 여기에 출전한 프랑스 팀들이 ACF(Automobile Club de France, 프랑스자동차클럽) 그랑프리로 발길을 돌린 탓이다. 이밖에 새로 시작된 경주도 자리를 잡아 나아갔다. 특히 1903년 ACF가 주최한 파리-보르도-마르세이유 경주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지만, 레이스를 중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카메이커의 압력을 견디지 못했다. 이후 자동차경주에는 도로 양쪽에 방호벽을 만들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1920년대 대공항 이후 모터스포츠 개화기 도래
프랑스자동차클럽이 세계 최초의 그랑프리(Grand Prix)를 주관한 이후 유럽 강국들은 레이스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1907년 영국 서리 주 브랜우즈에 처음으로 서킷이 등장했지만, 그와 동시에 유럽 모터스포츠계 전면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경제 불황에 이어 레이스 규정을 둘러 싼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로 인해 1909년 프랑스가 레이스를 보이콧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반대로 같은 시기의 미국 모터스포츠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1909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며 미국 자동차경주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인디애나폴리스 모터스피드웨이도 이 때 문을 열었다. 주행거리가 짧은 2마일 이내 오벌트랙은 서킷 전체는 물론 고속 레이스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높았다.
경제 불황이 사라진 1911년 이후 유럽 모터스포츠에는 개혁의 바람이 밀려들었다. 삼각형 모양의 서킷에 다양한 코너가 더해져 이전과 다른 레이스를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여파는 단순한 출력 경쟁에 머물던 경주차 개발에 영향을 미쳐 디자인과 엔진, 브레이크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1914년에 이르러서는 경주차의 기본적인 틀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분야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럽 모터스포츠는 위기를 맞았고, 다시 활기를 찾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21년 프랑스 르망에서 열린 ACF 그랑프리는 전쟁이 모터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미국계 드라이버들이 유럽파를 누르고 상위권을 휩쓸었다. 그러나 전쟁을 치르면서 상당한 기술과 지식을 축적한 유럽 기술진은 이를 밑거름 삼아 새로운 시대를 개척했다.
여기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이탈리아가 유럽 레이스를 평정했고, 유럽과 미국은 기술면에서 서로 다른 길을 되었다. 그 예로 미국에서는 슬림형 밀러 122 같은 경주차들이 고속 트랙인 스피드웨이를 달리기 위해 개발된 반면 유럽에서는 피아트가 고회전 엔진을 개발해 무게가 가벼운 805 섀시에 얹었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의 대공황은 유럽의 정치와 경제,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모터스포츠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비슷한 시기의 미국에서는 자동차클럽(AAC)이 인디애나폴리스에 포뮬러를 도입했다. 카메이커들을 레이스 트랙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비책이었다. 대공황이 서서히 걷히던 1930년 들어 이 작전의 효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따라서 대공황은 모터스포츠계가 도약할 수 있는 시험장이 되었다. 역사상 가장 멋진 경주차가 이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드라이버의 일부도 이 당시에 활약했다. 아킬레 바르지, 루이 쉬롱, 루돌프 카라치올라와 당대 최고 타지오 누볼라리가 주름잡던 시대였다.
이들은 ‘타르가 플로리오’와 ‘밀레 밀리아’ 등과 같은 고전적 레이스에서 실력을 겨루었다. 이탈리아 브레시아에서 로마를 왕복하는 산길을 달리는 획기적인 경주였다. 이 시대 최고의 선수들은 각기 자국 메이커 소속으로 출전했다. 누볼라리는 알파로메오, 카라치올라는 벤츠, 쉬롱은 부가티였다. 이들은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까지 5년에 걸쳐 세계 모터스포츠 정상을 이끈 주역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F1 월드 챔피언십 시대 열려
히틀러가 독일 정권을 장악한 1933년 1월, 고속 자동차를 좋아한 그는 모터스포츠를 나치 선전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을 세웠다. 이후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벤츠와 아우토 우니온은 최소무게가 750kg인 새 포뮬러 경주차를 개발했다. 이와 더불어 나치 정부가 국민을 선동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경주차의 기술과 출력이 개선되었고, 화려한 레이스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또한 독일 팀들이 이 시대의 자동차경주를 휩쓰는 발판이 되었다. 벤츠 W25와 아우토 우니온 타입 A는 1934년 베를린 아부스 서킷에 등장한 동급 최강의 경주차였다. 1934년 레이스는 벤츠 팀의 독무대. 아우토 우니온은 그 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모터스포츠는 아우토 우니온이 주름잡았다. 라이더 출신 로제마이어가 핸들링을 개선한 타입 B를 타고 서킷을 지배한 것이다.
독일 독점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뒤 모터스포츠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1948년 들어 거의 본궤도에 진입한 자동차경주는 2년 뒤부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F1 월드 챔피언십 시대를 열어가는 그랑프리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박기현(allen@trackside.co.kr), 사진/The ultimate encyclopedia of Formula One
[CopyrightⓒTracksid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